*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daum) 블로그의 지속적 편집 에러로 제대로 된 교정/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목/내용의 '네이버 포스트'를 권장합니다.
조사와 부패(Inquiries and corruption)
뉴질랜드 경찰은 부패했는가? 뉴질랜드 경찰이 부패의 영향을 받았다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몇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Colmar Brunton이 실시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지수에서 뉴질랜드 경찰은 5점 기준 평균 2.7점을 기록함으로써 일정 정도(moderately) 부패했다고 대중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 지수를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은 최악의 점수를 기록한 정당(3.3)보다는 덜 부패했지만, 사법부(2.5)나 군대(2.2)와 같은 다른 국가기관보다는 더 부패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3%는 경찰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Tansparancy International의 발표문을 보면 3%의 응답자가 경찰에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 대목은 기고자 Bryce Edwards가 과장했거나 오해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력 남용 차원에서의 부패는 드물다. 대부분의 부패는 권력, 법 그리고 대중의 신뢰에 대한 남용*이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뉴질랜드 경찰은 7명의 시민을 총기로 사망케 했는데 그 중 한 명은 길 가던 행인이었고 두 명은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7건의 사고 모두 경찰은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패 케이스는 Arthur Allan Thomas(이전 포스팅 '뉴질랜드 대중은 경찰을 신뢰할까? (上)' 참조: 역자 주)의 사건에서 허위 증거 조작으로 그를 증거불충분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다. 위(이전 포스팅: 역자 주)에서 열거한 스캔들의 일부는 뉴질랜드 경찰이 비윤리적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학자들은 때로 이것을 “숭고한 부패(noble cause corruption)”라고 부르는데 부패 행위들이 종종 올바른 목적을 위한다거나 “대의(greater good)”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즉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아” 라는 윤리다.
전직 경찰 수사관이자 의회정치가인 Ross Meurant는 이런 종류의 행위를 “열성적 부패(corruption of zealousness)”의 등장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런 행위는 “경찰이 사회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믿음이 경찰 내에 팽배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용의자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태생적으로 보수적이고 대부분 편견적이며 비관용적인 경찰 문화”가 이에 일조한다고 덧붙인다.
2년 전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인 Catrina MacLennand은 경찰의 불법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경찰의 불법 행위 관행은 너무 만연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경찰의 수사와 감시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독립적 리뷰를 주장했다.
또 경찰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죄를 확정 짓기 위해 결사적일 수밖에 없는 관료적 형식주의 요소가 있다. 특히 살인사건 100% 해결률은 경찰이 자신을 증빙하는 필수적 척도가 되었다. 범죄에 대한 정치와 미디어의 관심은 경찰이 이 목표를 달성하라고 요구하고 기대한다.
저명한 왕실고문변호사(QC) Peter Williams는 Teina Pora 사건과 관련, “경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고 자백을 받기 위한 교묘한 술수를 사용했다. 모든 시스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의자를 유죄로 몰고 가게끔 되어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시스템이 부패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couldn’t altogether disagree)”고 결론지었다.
바뀌는 경찰의 얼굴(The changing face)
경찰 운영진은 경찰력을 현대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생산성 떨어지는 백인 남성(pale, male and stale)”이란 경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보다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진보적으로 보이기를 원한다.

경찰은 그들의 공식적 핵심 가치에 “공감(empathy)”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valuing diversity)”을 새롭게 포함했다. 예를 들어 최근 경찰 운영진은 조직 내 LGBT 경찰관과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복을 입은 경찰이 정례 Auckland Pride* 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했다.
*하지만 2019년 행사 주관 이사회에서는 행사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 제복 경찰관의 행진 참여를 금지했다. 이 조치에 반발하여 보다폰이나 스카이 시티 같은 대기업 스폰서들이 줄줄이 후원을 중단 선언했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그룹은 크라우드펀딩을 조성해서 3만 불이 넘게 모금한 바 있다. 제복 경찰의 참여는 2020년 다시 허락되었다.
경찰의 와이탕이 조약 준수와 마오리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위한 경찰의 견고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마오리 공동체는 경찰의 의사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노력의 결과, 경찰의 인구 구성은 비교적 빨리 바뀌었다. 이제 경찰의 11%가 마오리*다(1950년 전에는 아예 마오리를 뽑지 않았다)
*2019년 현재 경찰 내 마오리는 13%를 차지하며 궁극적으로 뉴질랜드 마오리 인구 비율(2018년 센서스에 의하면 16.5%)과 같은 비율을 목표로 한다고 담당 장관은 말했다.
여성경찰관 역시 강하게 격려되고 있으며 이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경찰은 리얼리티 티비 쇼, Women In Blue,’에 출연하여 경찰이 여성 친화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도 홍보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을 기꺼이 인정했다.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경찰관들은 91개의 티비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은 Police Ten 7으로 총 240회의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또 Facebook, Twitter 그리고 블로그 등이 경찰 활동의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쇼 윈도우 장식에 불과할까?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홍보이며 겉보기에 그럴듯한 마케팅이 틀림없다. 경찰은 이제 그들을 “공동체의 한 부분(part of the community)”으로 칭하는 등 자신들을 홍보하는 언어들을 훨씬 자주 사용하며 심지어 범죄에 대한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을 거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변화는 실질적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우회적 지도(diversion)와 경고를 훨씬 많이 사용함으로써 “대안적 해결(alternative resolution)”이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찰 내 젠더와 에스닉 그룹의 변화가 경찰의 보수적이고 기득권 지향 풍조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까?* 여전히 체포 현장과 유죄 판결에서 마오리의 과도한 비율은 진행 중이다.
*마오리 경찰 중 최고위직인 부청장에 올라 있고 마오리 카운슬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Wally Haumaha의 경우 2004년 Louise Nicholas가 경찰관들에게 윤간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a nonsense(말도 안 되는 소리)"며 "nothing really happened and we have to stick together(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자기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2018년 다시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해 수상 제신다 아던 표현을 따르면 “cleary inappropriate(명백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현대적 마케팅은 경찰이 여전히 본질에서 변함이 없으며 자주 억압적이며 때로 현 상태를 지키려는 “융단 장갑 속의 무쇠 주먹(the iron fist in the velvet glove)”같은 기관임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IPCA - 감시견 혹은 강아지?(IPCA - watchdog or puppy?)
IPCA(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는 경찰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감시견이기보다는 애완견(lapdog)으로 종종 여겨진다. 과연 이 기관이 경찰의 무능함과 불순한 의도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판사 Sir David Carruthers*의 단호한 리더십 아래에서 이 기관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조사는 더 솔직하고 비판적이다.
*Sir David Carruthers는 2017년 은퇴했고 뒤를 이어 판사 Colin Doherty가 취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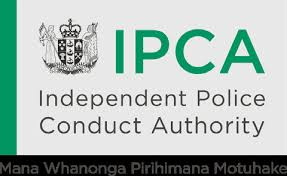
그럼에도 과연 이 기관이 경찰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 간단히 말해 그 IPCA의 이빨이 그리 날카롭지 않다 - 예를 들어 IPCA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수도 없다. 경찰에 대해 기소할 수도 없으며 권고 사항을 강제할 능력**도 없다. 실제로 경찰은 때로 IPCA의 권고를 조롱***하기도 한다. 그리고 IPCA의 업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 - 경찰관이 한 남성의 목을 부러뜨린 것에 대한 컴플레인에 대해 리포트가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다.
*2012년 IPCA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경찰서 구류 중 발생한 사망자 숫자가 27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오직 4건만 경찰의 부주의 혹은 업무 태만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경찰의 차량 추적으로 24명이 죽고 9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기간 IPCA는 여러 차례 경찰의 차량 추적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사망률은 계속 증가했다. 2010년 18명이 경찰의 차량 추적으로 말미암아 사망했는데 이 중 14명은 경범죄로 촉발된 것이었다.
****2008년 Wairarapa 지역 경찰이 수백 건의 아동 성추행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Masterton 경찰서 범죄수사대장 Mark McHattie는 142건의 미제 사건 중 남은 것은 29건이라고 발표했으나 IPCA 조사 후 그 중 33건이 제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Mark McHattie는 이후 오클랜드 경찰서 범죄수사대(CIB)의 중범죄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IPCA는 접수한 컴플레인의 90%를 다시 경찰 스스로 조사하게 하고 있다. Police Association(경찰관 협회)*의 회장 Greg O’Connor(현재는 Chris Cahill:역자 주)를 따르면 대중의 컴플레인은 경찰에 의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컴플레인을 “경박하며(frivolous)” “프로불편러(perennial complainers)”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IPCA에서 아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기관에서 일하는 수사관들이 대부분 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경찰관 협회는 경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조라고 할 수 있다. 일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constabulary police)의 99%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전체 경찰 종업원의 75%가 회원이다. 다른 사기업의 노조처럼 이 협회는 고용주인 경찰 운영진으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그 목적 실현 과정은 종종 뉴질랜드 대중으로부터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귀결된다. 가령 대중으로부터 컴플레인의 대상이 된 회원 경찰관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못하게끔 경찰 수뇌부에게 압력을 넣는 것이 그 방식이다.

따라서 알려진 경찰의 불법성과 비행 대부분은 이 감시 조직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미디어 혹은 우발적으로 법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IPCA 역시 기득권층의 한 부분이 아닐까? 흥미롭게도 이사회 멤버 중 한 사람인 판사 Lowell Goddard는 최근 영국에서 뉴질랜드에는 기득권층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실 IPCA의 이사회는 기득권층의 한 부분과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SIS(New Zealand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뉴질랜드 보안정보국) 전임 이사였던 Richard Wood가 이사회 멤버였다. 그리고 경찰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the Office of Auditor General)마저도 전임 경찰청 부청장이었던 Lyn Provost가 수장으로 있었다.
건강하지 못한 기관(An unhealthy institution)
경찰은 많은 기능을 훌륭히 수행한다. 하지만 조직이 대중에게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알아야 할 것은 경찰은 범죄와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뭔가 잘못 진행될 때 - 건강이 쇠퇴할 때 - 엄청난 파급력이 발생하면서 증거불충분 유죄판결(unsafe convictions)을 불러 일으킨다.
*뉴질랜드 사법 시스템에서 법무부, 검찰 그리고 경찰의 역할 분담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기소권을 경찰이 가진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의 현 검찰 위상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독점적 기소권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견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독립적 괴물 조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뉴질랜드 경찰과 한국의 검찰은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이동온 변호사가 교민지에 기고한 컬럼을 참조하기 바란다.
만약 경찰 자체적인 변화가 어렵고, 느리며 겉치레에 그친다면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법원, 정치인 그리고 압력단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이들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IPCA에 자원, 조직적 문화적 독립성 그리고 못마땅해하는 경찰이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무기를 줘야 한다.
*뉴질랜드 경찰 내 따돌림(bullying) 문제도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다. RNZ의 21명 경찰관 취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따돌림은 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경찰 내부의 컴플레인 해소를 위한 직통 보고 시스템인 Speak Up이 있지만, 경찰관은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컴플레인이 바로 컴플레인의 대상이 된 상관에게 보고되기 때문이다. 또 인사부 소속 직원에 따르면 많은 컴플레인이 본질에서 따돌림인데도 의도적으로 따돌림으로 구분되지 않고 다른 명목의 컴플레인으로 구분된다. 또 경찰 내 노조에 해당하는 Police Association에 도움을 요청해도 일정 보상을 받고 함구하거나 만약 컴플레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좌천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드바이스만 받는다. 그래서 최후의 선택으로 많은 경찰이 복귀 후 상황 변화를 기대하며 장기간 휴가를 떠나기도 하나 다수는 경찰로 복귀하지 않았다. 2020년 경찰은 이 Speak up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인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설사 아무 죄가 없더라도 경찰과 등을 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으로서는 건강하지 못한 조직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자 맺음말
개인적 차원에서 뉴질랜드 경찰에 대한 나쁜 경험은 없다. 특별히 인종차별적이라거나 고압적인 느낌은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미디어와 학자들의 통찰은 이 조직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충성 경쟁을 조직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경찰은 비록 정부의 한 부서고 담당 장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일선 경찰은 ‘국가(Sovereign 혹은 State)’에 충성 서약을 하지 ‘정부(Government)’에 하지 않는다. 즉 ‘경찰력(Constabulary)’에 관한 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셈이다. 이런 역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상도 담당 장관도 그리고 감시단체인 IPCA도 못마땅해서 볼 멘 목소리를 낼지언정 큰 소리는 못 낸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치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국 검찰 윤석렬의 언급을 떠올리게 한다. 말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지 실체 없는 국가이기에 조직의 상관이자 그의 명령이 국가인 셈이다. 이런 면에서 군대 조직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 행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조직의 관행에 대해 묻지 마 추종을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라고 할 수 있는 Police Association은 경찰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시적 관점은 결여한 채 협회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인권보다는 경찰 운영진과의 밀당을 통해 대외적으로 경찰 수뇌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회원들에게 경찰 수뇌부의 지도 방향을 지지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반대급부로 회원들에게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이처럼 많은 부조리와 폐단을 갖고 있는 경찰이란 조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대안적 모델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
'뉴질랜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없는 자들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장례 - 뉴질랜드 죽음 시리즈 2 (0) | 2020.07.08 |
|---|---|
| 오클랜드 공동묘지 이야기 - 뉴질랜드 죽음 시리즈 1 (0) | 2020.07.03 |
| 뉴질랜드 경찰은 신뢰할 수 있을까? (上)- 경찰 이야기 2 (0) | 2020.06.16 |
| 뉴질랜드 경찰의 인종차별 - 경찰 이야기 1 (0) | 2020.06.12 |
| 뉴질랜드 BLM 시위 그리고 미국 경찰의 간략 역사 (0) | 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