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께 안내드립니다. 좀 더 나은 교열과 가시성/가독성을 원하는 분에게는 '네이버 포스트(링크)' 를 권장합니다.
자주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들어갈 때마다 흥미로운 기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뉴질랜드의 시사/문화 평론 온라인 매거진이 있다: The Spinoff. 특히 이곳에서는 한국 교민 1.5세대와 2세대들의 활동을 간헐적으로 엿볼 수 있어서 좋다. 예를 들어,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되었던 Jihee Junn(전 지희)과 Joanna Cho(조 은선)가 그 예다. 그들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들의 직업 영역이라기보다는, 이민 1세대 관점에서 그리고 ethnic relations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1.5세대(혹은 2세대)로서 그들의 정체성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스핀오프에서 알게 된 Sloane Hong(한국명 홍 의한) 역시 나에게 여러 면에서 궁금증을 안겨주었다. 1991년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Sloane Hong은 정확히 언제 뉴질랜드에 왔는지 알려진 바 없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후 이주했다는 점에 1.5세대로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이전 Joanna Cho 경우처럼 취학 이전에 뉴질랜드로 이주했을 경우 실질적 2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스핀오프에서 ‘이달의 코믹’(Comic of the Month)으로 Sloane Hong의 작품 “The Nagarjuna”을 선정한 관계로 이번에 소개되었다.

이 글에서 나는 Sloane Hong에 대해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이름을 계속 호칭할 것이다. 한국어의 단수 3인칭 대명사는 대상의 성별에 따라 ‘그녀’ 아니면 ‘그’로 갈라지는데, Sloane의 경우 Spinoff와 Linkedin의 자기소개란에서 자신을 ‘trans’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름 앞의 타이틀도 She/He 혹은 Ms/Mr가 아닌 They로 규정했다. 영어 they는 복수 3인칭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단수 3인칭 대명사로 영어 문장에서는 쓰인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이에 상응하는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단수 3인칭 대명사를 나는 모르겠다.

Trans는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 transgender(성 전환자)의 약자로서의 의미도 가지나, 그 외에도 여성도 남성도 아닌(non-binary) 제3의 성(genderqueer)도 포함한다. 따라서 Sloane이 성 전환자인지 제3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혹은 사회 규범적 성 정체성이 이후 성장하면서 변화를 겪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이름 홍 의한도 이름만으로는 성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만든 영어 이름 Sloane 역시 그렇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사용되는 이름이지만 남성도 사용한다. 즉, 이름만으로는 쉽게 성별 판단을 하기 어려운 unisex 이름이다. 새로운 성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런 unisex 영문 이름을 고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소개한 것도 흥미롭지만 이후 이어지는 정체성 소개도 흥미롭다.

“Sloane Hong is a trans, Korean-tauiwi illustrator, comic artist and tattooer based in Tāmaki Makaurau, Aotearoa.” Linkedin의 자기소개다. 성 정체성으로 tans로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소개한 정체성은 ethnic 정체성이다: Korean-tauiwi. Sloane이 Korean을 에스닉 정체성으로 공개한 것도 흥미롭다. 그에게 한국인 정체성이 그에게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차지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언뜻 둘러본 그의 작품에서 간혹 한국의 흔적이 발견되기는 한다. 아래 그림이 그 예다.

그리고 2020년에 발표한 코믹의 제목을 ‘여의보주’라고 한글로 표기했다. 위 그림과 한글 코믹 제목을 보았을 때 그 실체가 명확지 않지만 그에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남아있는 듯하다. 여의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주의 다른 표현이다. 불교 설화에서 유래한 이 용어의 기원은 인도 신화인데, 이번에 이달의 코믹으로 선정된 그의 코믹 제목 역시 우리에게 용수보살로 알려진 2세기 경의 인도 대승불교 사상가 나가르주나(Nagarjuna)를 인용했다. 따라서 Sloane은 동양 쪽이 되었든 불교 쪽이 되었든 한국적 정서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그 정서와 세계관을 자신의 작품 세계에 계속 반영할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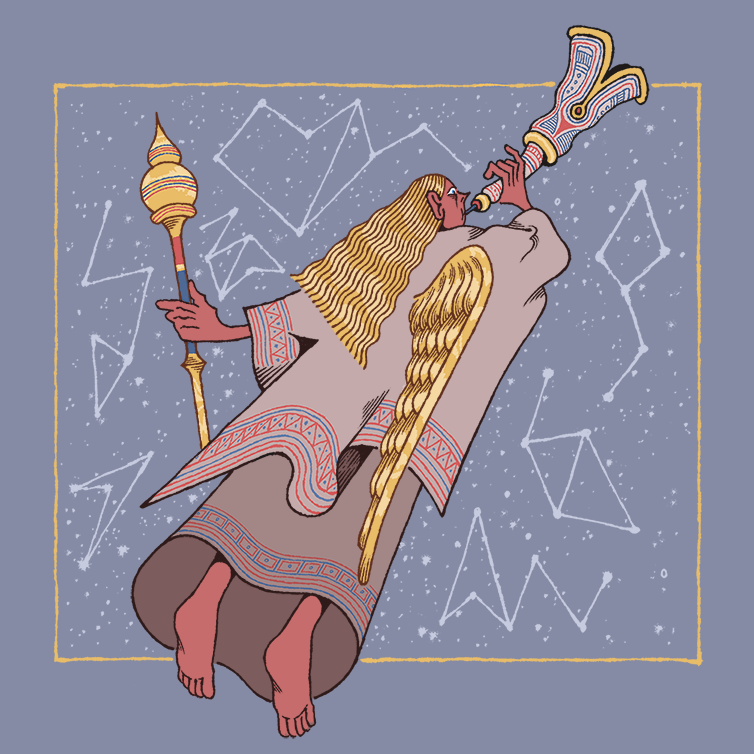
그다음의 정체성은 tauiwi이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표현에 이 용어를 쓴 것은 처음 본다. 왜냐하면 tauiwi는 ‘마오리가 아닌 사람’으로 번역되는 표현인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통한 정체성 표현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부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Korean은 긍정적 형식의 정체성 표현이지만, tauiwi는 부정적 형식의 정체성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상상력의 날개를 다시 펴본다면, Sloane은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의 원주민(tangata whenua)으로서의 지위에 절대적 지지를 표명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마오리 땅에 와서 사는 코리안으로 에스닉 정체성을 정리하고 싶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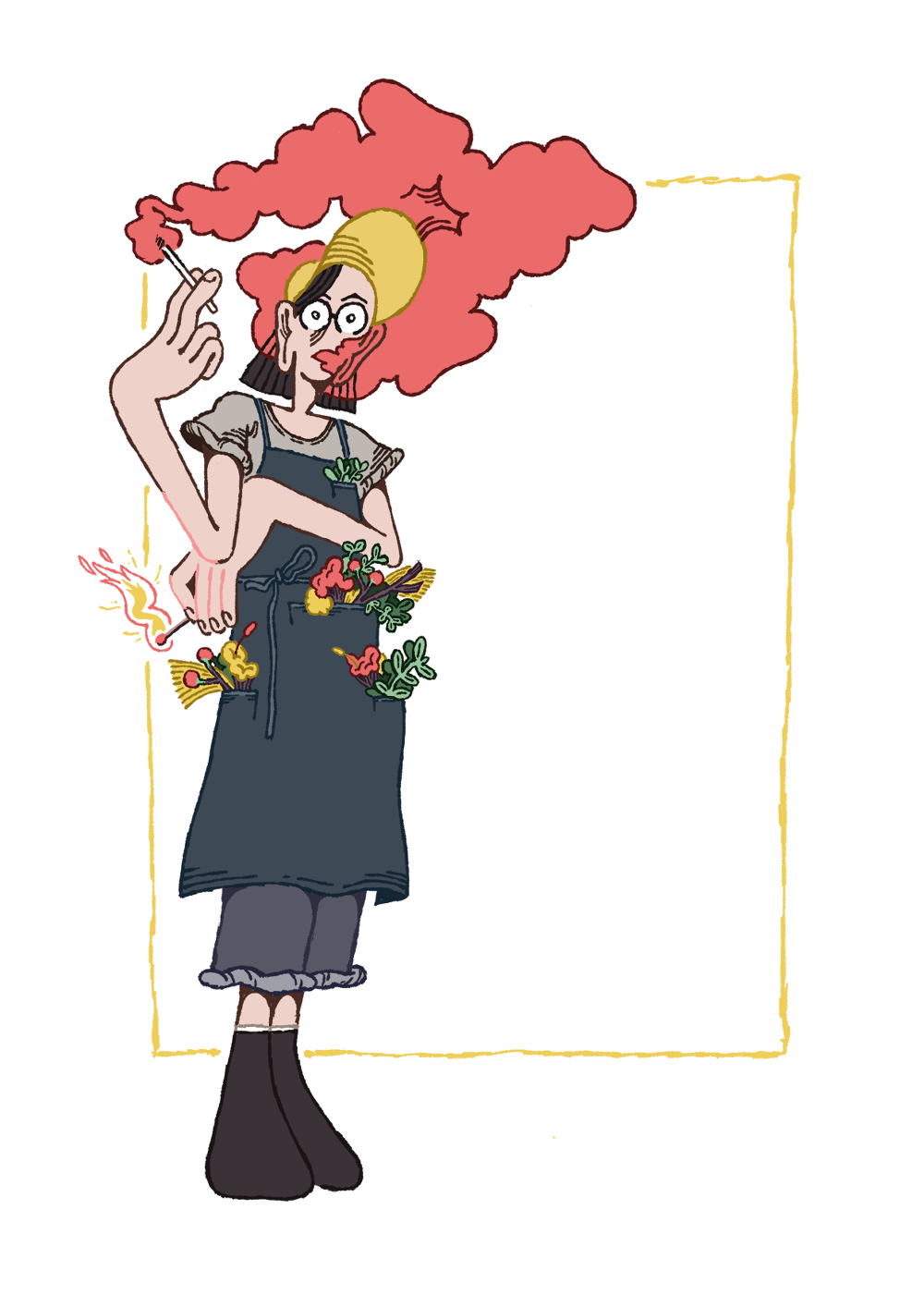
이런 나의 상상이 터무니없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는 이어지는 그의 거주지 소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국은 New Zealand의 Auckland인데 이 두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대신, Aotearoa의 Tāmaki Makaurau로 자신이 사는 지역을 표시했다. 뉴질랜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모르는 외국인이 보았다면 Sloane이 뉴질랜드에 사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 중에도 Tāmaki Makaurau가 뉴질랜드 어디 있는 동네인지 검색할 사람이 꽤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파케하의 그림자를 자신의 정체성에서 지우려고 하는 듯하다.

Sloane의 직업은 프리랜서 illustrator(삽화가), comic artist(코믹 작가) 그리고 tattooer(타투 시술)이다. 앞으로도 Sloane의 건투를 빈다.
'뉴질랜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능한 포퓰리스트 선출직 대표, 관료주의에 KO 패 당하다 (0) | 2023.01.31 |
|---|---|
| 시내버스, 시에서 직접 운영할까? - 뉴질랜드 시내버스 이야기 (2) (0) | 2022.08.18 |
|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라 (0) | 2022.03.18 |
| 주택, 기름에 이어 식료품 가격까지 - 제신다 아던의 반동적 무능함 (0) | 2022.03.14 |
| 뉴질랜드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0) | 2022.03.01 |